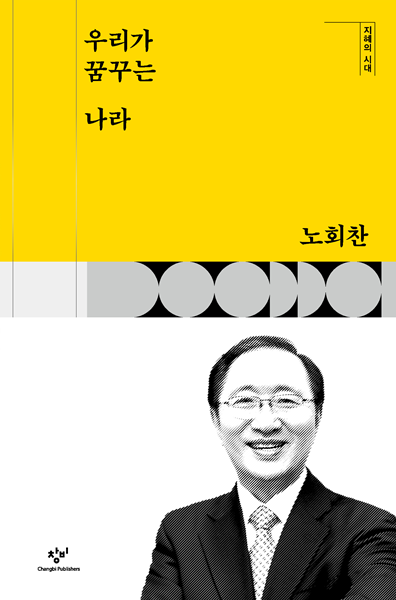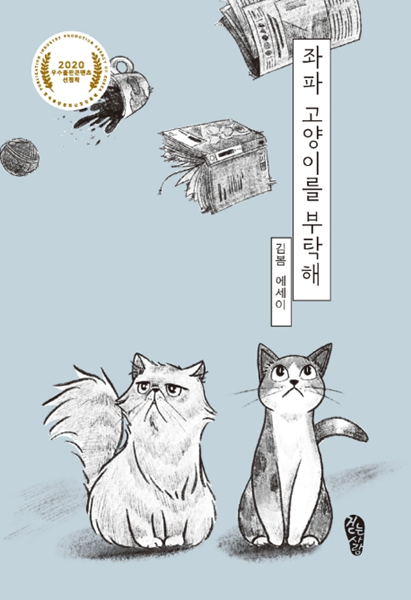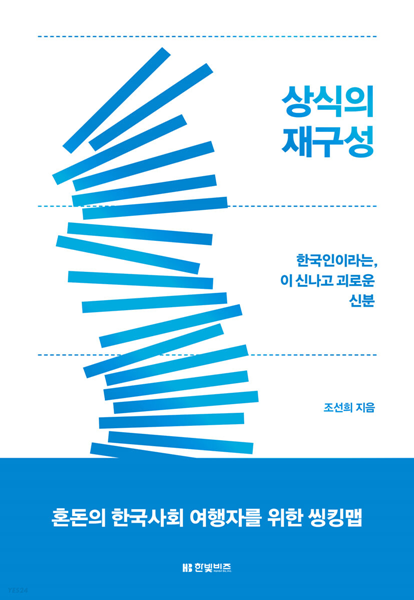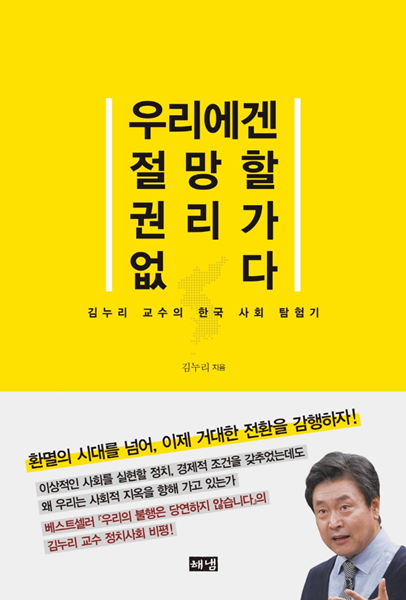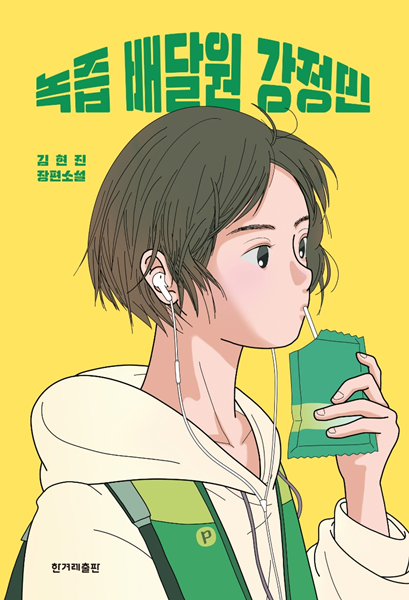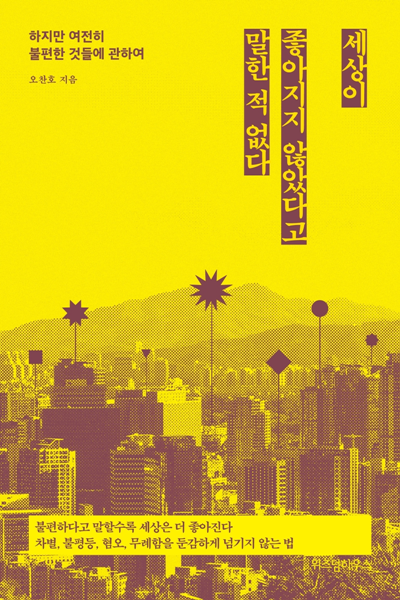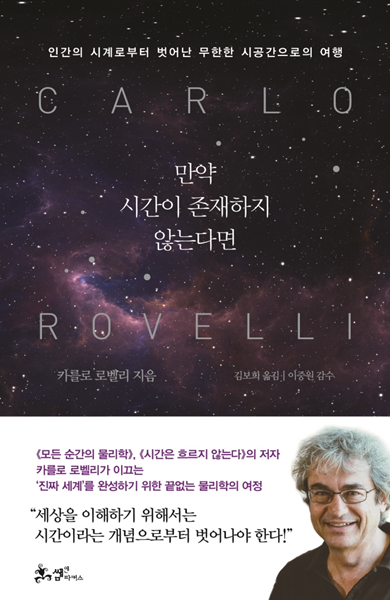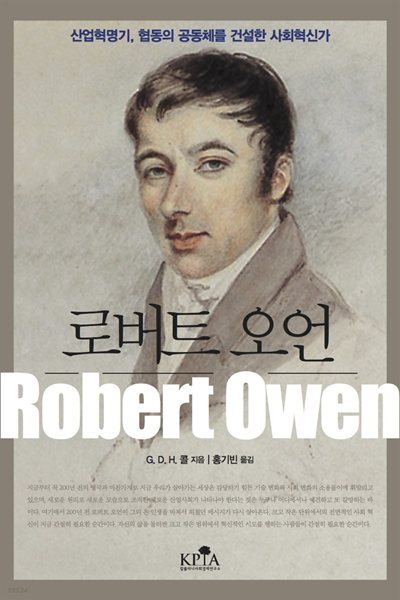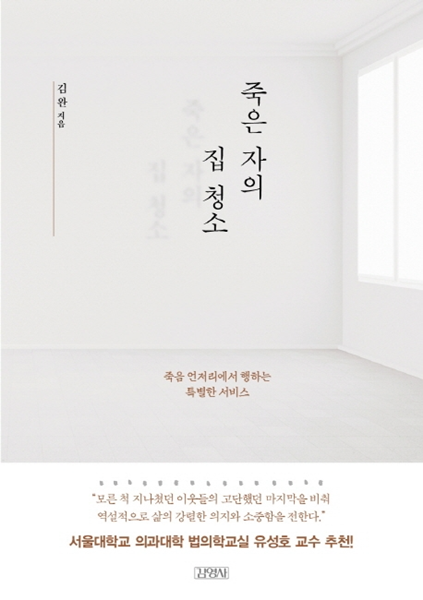능력주의와 불평등 -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는 믿음에 대하여

사람들은 지위 세습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도, 막상 세습과 다르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능력주의 시스템에 대해선 지나치게 옹호적이다. 신분제와 세습제라는 것이 절대 악처럼 묘사될수록 능력주의는 절대 선인 양 오인되었던 것이다. (8) 능력주의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같은 인류의 오래된 비례적 정의관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강렬한 호소력을 지닌다. 능력주의에 대한 연구들 중 상당수가 능력주의를 가장한 세습주의, 사이비 능력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결론에 가서 '진정한 능력주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은 그만큼 떨쳐 내기가 쉽지 않다. (9)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내부에서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체제를 정당화한다. 능력주의가 평등을 대체하면서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는 운동도 능력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능력주의는 분명히 차별이지만 차별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평등', 더 정확히 말하면 '공정'으로 인식된다.(19) 능력주의의 대표적인 비유는 달리기 등의 경주이다. 이때 우리는 출발선(기회)이 같았는지, 규칙(과정)은 공정한지, 이로부터 도출된 서열과 승패(결과)가 정당한지를 보게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나 삶은 개개인이 참가하는 경주나 시합이 아니다. 경주나 시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일 뿐이다. 사회와 삶 전체를 경주로 보면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속도와 기록을 재기 위한 시험과 평가로 생애를 채워 나가야 한다. 불필요한 경쟁과 무의미한 고통이 다수에게 요구된다. 이에 집중하다 보면 평가와 차별의 룰을 만들고 시행하는 권력은 가려지게 된다. (31) 능력의 현실태인 점수는 인간을 오직 하나의 비교 값으로 투명하게 만든다. 한 인간을 둘러싼 가문, 경력, 사상 같은 온갖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직 점수로 본인 자신과 혹은 타인과 비교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사람들은 점수를 보면 한 개인의 능력을 직관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고